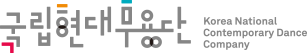공연정보
작품소개
현대무용 생태계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자생적 창작 환경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지역상생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은 국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안무가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동시대 사회와 역사, 그리고 사람에 관한 주제의식을 담은 현대무용 레퍼토리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극장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모를 통해 해당 지역 안무가를 선정, 2024년 지역상생 프로젝트는 세종예술의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산시민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이 파트너 극장으로 참여해 4편의 작품을 제작한다. 또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안무작 ‘정글’과 어린이 무용 ‘얍! 얍! 얍!’ 공연이 함께해 풍성한 무대가 펼쳐진다.
● 세종예술의전당 공연 일정
| 2024.9.25(수) | 수선되는 밤 안무 박재현 아니요, 네 안무 정진아 |
세종예술의전당 대극장 | 예매하기(클릭) |
| 2024.9.28.(토) | 켜켜 안무 최재희 몹 안무 박수열 |
세종예술의전당 대극장 | 예매하기(클릭) |
| 2024.10.1.(화). - 10.2(수) | 얍! 얍! 얍! 안무 밝넝쿨&인정주 | 세종예술의전당 대극장 | 예매하기(클릭) |
| 2024.10.5.(토) | 정글 안무 김성용 | 세종예술의전당 대극장 | 예매하기(클릭) |

정글
얍!얍!얍!
몹
수선되는 밤
이정표 없는 길의 방향을 잃은 낯선 자들의 발자취를 통해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아낸 작품이다. 뱀에 물려 더뎌지고 정체가 되는 깊은 밤의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여정들.
아니요, 네
켜켜
시간의 누적, 층위의 흔적들을 공간화하고자 한다.
작품 <켜켜>는 시간의 시각화에 대한 접근으로 삶의 과정 속 우연과 필연으로 겹쳐 있는 시간 층위의 흔적들을 탐색한다. 오감을 통해 몸에 저장되고 응축되었던 흔적의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재해석하여 기억의 질량들을 시각화하여 공간화하고자 한다. 다양한 층위의 흔적들을 공간 안에 어떻게 풀어 꺼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순간의 찰나에 대한 긴박함과 느슨함이라는 시간 개념들을 해체와 조합의 방법들로 접근하고자 한다.
_(c)국립현대무용단_황인모(1).jpg)
_(c)국립현대무용단_황승택(5).jpg)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자라나는 모든 움직임을 향해
온 몸으로 외치는 응원의 춤
얍! 얍! 얍!
하나 그리고 둘
겨울에서 봄으로
작지만 거대한 리듬
어제 오늘 내일
출연진/제작진
안무
국립현대무용단_최근우.jpg)
박수열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를 졸업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 통합예술치료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수무브’ 대표이자, 무용교육가 겸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창조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작업해 왔으며, 현재는 몸을 기반으로 탐구하는 작업을 시도하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3년 슬로베니아 프론트 페스티벌, 일본 제8회 오도루 아키타 무용축제, 제 14회 라오스 FMK 국제 무용 페스티벌, 2024년 4월 에스토니아 1000 크레인스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공연했다. 2023년 12월에는 요코하마 댄스 컬렉션 ‘컴페티션 1’에서 심사위원 특별상(Encouragement Award)를 수상했다. 한국 안무가로는 유일한 결선 진출자였으며 요코하마 댄스 컬렉션이 시작한 1996년 이래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준 특별상이다. 2025년 필란드 국제무용 콩쿠르 문화 교류 행사에 초청받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안무
국립현대무용단_최근우.jpg)
박재현은 부산에서 활동해 온 무용수이자 안무가다. 2000년 프랑스 리옹 무용단의 객원 무용수 참여를 기점으로 2000년 제18회 KBS 부산 무용 콩쿠르 대상 등 입상을 통해 무용수로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2016년 ‘경희댄스시어터’를 창단해 개성 있는 움직임과 독창적 춤 빛깔을 나타내며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 200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무가 집중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작품 ‘그 녀석=크라잉’을 기점으로 안무가로서 본격적인 시작점을 알리게 된다. 2009년 유네스코 주최 제3회 문화올림픽 세계 델픽대회
안무
국립현대무용단_최근우.jpg)
정진아는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안무가 겸 무용수다. 2011년부터 ‘메타 댄스 프로젝트’의 단원으로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왔고,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창작작업을 시작했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주로 영감을 받으며, 그것을 모티브로 무용수만의 개성을 살려, 진정성 있는 움직임 표현에 중점을 두어 작업한다. 2014년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차세대 artistar>에 선정되어 임펄스탄츠-비엔나 국제 무용제에 참가, 2015년 대전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30 –1> 첫 개인 공연을 선보였다. 2022년에는 프로젯 뉴망(Projet Nuement)이라는 무용 단체를 설립했으며, 대전문화재단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안무
국립현대무용단_최근우.jpg)
최재희는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및 체육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몸의 가능성’ 주제를 가지고 춤의 본질에 집중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현재 퍼포밍아트 더몸(MOMM)의 대표이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4 꿈의 무용단 군산 무용감독과 한국현대무용협회이사, 한국무용예술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CDP_Coll. Dance Project의 창단대표로 제26회 서울무용제 자유참가부분 건너다(Get Crossing)의 작품으로 최우수 안무가상을 수상, 제27회 서울무용제에 출전하는 기회를 획득하였으며, 2007년 서울무용제 ‘마르지 않는 샘’의 작품을 통하여 주역남자무용수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서울문화재단 젊은 예술가 나트(NarT·New Arts Trend)에 선정되어 작품 ‘소통’을 안무하였으며, 2017년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에서 <뾰족한 지렁이의 발톱>으로 해외심의 위원상을 수상하여 2018년 미국 ‘92Y 하크니스 댄스 센터’
안무
BAKi.jpg)
“무용은 말로 할 수 없는 말이다”라는 철학을 가진 김성용 단장은 ‘가장 진실한 표현도구’로서의 춤을 추구하며, 무엇보다 솔직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예술임을 강조한다. 말로는 도저히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움직임으로 구현해내는 그에게 안무작업은 늘 새로움의 보고 속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가 개발한 ‘감각과 반응’에 집중한 무브먼트 리서치 ‘Process init’은 이런 그의 작업과정을 더욱 공고히 한다. 비정형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Process init’을 통해 그의 안에 들어온 예술적 영감은 무대 위에 가시적인 형태로 구체화된다. 15세에 무용을 시작한 그는 1997년 20세에 동아무용콩쿠르 금상을 최연소 수상, 일본 나고야 국제 현대무용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하는 등 무용수로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100여 편 이상 선보인 그의 안무작들은 해외 유수의 극장 및 국내에서 공연됐으며 다수의 수상 이력을 통해 그 능력을 검증한 바 있다. 또한 대구시립무용단에서 보여준 행정 능력은 40대 젊은 단체장으로서 새바람을 일으키며, 특유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무용수들의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무용단을 다각도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용수에서 안무가로, 행정가로 자신의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김성용 단장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젊고 창의적인 리더십과 한국의 현대무용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주길 바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안무

‘나의 춤과 삶 그리고 극장‘이라는 뜻의 무용단체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를 2006년 함께 창단했다. 춤의 본질에 다가가는 작품 활동과 동시에 현대무용의 대중적인 접근을 끌어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2016년부터 ‘미래를 여는 프로젝트-동심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란 화두에 집중하며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청소년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무용 작업을 통해 춤의 가능성을 확장해 오고 있다. 무용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제28회 아시테지(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서울어린이연극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일본 아시테지 세계총회, 헝가리국제연극올림픽 어린이공연 부문에 한국 대표로 초청되는 등 한국의 어린이 무용을 국내는 물론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어린이 무용 ‘얍! 얍! 얍!’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여덟 번째 작품으로 생명력을 주제로 다양한 몸의 리듬을 탐험하며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온 작지만 거대한 ‘성공’의 의미를 다시 밝힌다.